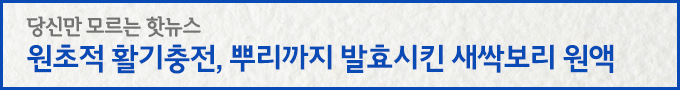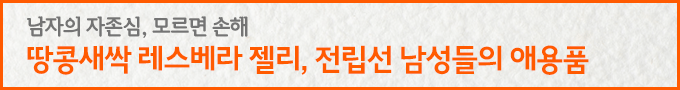| 정몽헌씨 유서 속 "윙크 버릇 고치세요" 온갖 구설 뚫고 따스한 인간미 드러내 테너 카루소 남긴 "여보, 숨이 안쉬어져" 전태일의 "배 고프다" 유언만큼 인간적 지니고 있는 한국어 사전에서 ‘유언(遺言)’의 뜻을 찾아보니, “(1) 죽음에 이르러서 부탁하여 남기는 말. 유음(遺音). (2) 죽은 뒤에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단독 의사 표시”라고 풀이돼 있다. 두 번째 뜻의 유언은 재산상속과 깊이 관련돼 있는 법률 용어다. 민법전은 제5편 ‘상속’의 제2장 전체를 ‘유언’에 할당하고 있다. 제1060조에서 시작해 제1111조에서 마무리되는 상세한 규정이다. ‘유언’ 규정이 그리도 자세한 것은 재산상속을 둘러싼 법률 분쟁이 그만큼 잦고 민감하다는 뜻이겠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살필 유언은 첫 번째 뜻의 유언, 곧 일반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말들이다. 이른바 ‘마지막 말들’ 말이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아는 일이 누구에게나 가능하지는 않은 만큼, 누구나 그럴싸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돌연사의 경우엔 유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유서를 써 놓을 수는 있겠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도 더러 유서를 쓴다.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2003년 몰)은 충격적인 투신에 앞서 쓴 유서들 가운데 한 통에서 김윤규 당시 현대아산 사장에게 “당신, 너무 자주 하는 윙크 버릇 고치십시오”라는 말을 남겼다. 앞이 창창한 듯 보였던 재계 거물의 마지막 말에 배어있는 따스함과 유머 감각은 그의 자살을 둘러싼 구설의 휘장을 가뿐히 뚫고 자연인 정몽헌의 매력을 드러냈다. 한국인이 남긴 유언 가운데 가장 비통한 것 하나는 구한말 유학자 황현(1910년 몰)의 손에서 나왔다. 국치 직후 그는 절명시(絶命詩) 네 편을 하룻밤 사이에 짓고 아편을 삼켜 목숨을 끊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시는 이렇다.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네/ 무궁화 온 세상이 이젠 물 속으로 가라앉네/ 가을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 역사를 되새기니/ 어렵구나,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가(鳥獸哀鳴海岳嚬/ 槿花世界已沈淪/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이순신(1598년 몰)이 노량해전에서 적탄을 맞은 뒤 남겼다는, “싸움이 한창이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유언은 이 위대한 군인의 아우라에 숭고함을 한껏 더하며 사람들을 숙연하게 한다. 무용(武勇)과 지략에서 더러 이순신에 비견되는 영국의 제독 호레이쇼 넬슨(1805년 몰)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이순신의 마지막 순간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내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 주신 걸 하느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이런 기개와 대범함은 최량의 무인들에게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병상에서 죽음을 맞은 문인들의 마지막 말은 한결 소박하다. 문학평론가 김현(1990년 몰)이 서울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흘린 말은 ‘녹즙’이었다고 한다. 김현의 제자인 소설가 이인성은 고인을 회고하는 글에서 이 일화를 전하며, “그것(녹즙)이 선생이 상상한 가장 순결한 음식, 생명의 엑기스였을까?”라고 덧붙이고 있다. 김현의 이 녹즙은, 그보다 반세기 앞서 소설가 이상(1937년 몰)이 도쿄대 병원에서 발설했다는 ‘멜론’(이 아니라면 레몬?)을 연상시킨다. 1970년대를 열어 제친 전태일(1970년 몰)의 분신 이후 적잖은 공적 자살자들은 사회를 향한 요구를 유언으로 남겼다. 전태일은 제 몸을 불사르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외쳤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이 다하기 직전 “배가 고프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의 이 마지막 말은 그가 몸을 사르며 외쳤던 정치 구호를 육체적으로 완성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유언이다. 반미자주화의 대의가 젊은 영혼을 사로잡았던 시절, 대학생 김세진과 이재호(1986년 몰)는 한 날 한 시에 제 몸을 불사르며 “반전반핵! 양키 고홈!”을 외쳤다. 지리산 뱀사골에서 급류에 휩쓸려 삶을 마감한 시인 고정희(1991년 몰)는 ‘독신자’라는 시를 정서해 책상 위에 남겨놓았는데, 마치 자신의 죽음을 미리 그린 듯해 오슬오슬하다. “크고 넓은 세상에/ 객사인지 횡사인지 모를 한 독신자의 시신이/ 기나긴 사연의 흰 시트에 덮이고/ 내가 잠시도 잊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달려와/ 지상의 작별을 노래하는 모습 보인다.” 고정희의 영국인 선배 크리스티나 로세티(1894년 몰)의 시 ‘노래’는 그 자체가 어여쁘고 구슬픈 유언이다. 그 첫 연은 이렇다.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이여/ 나를 위해 슬픈 노래 부르지 마세요/ 머리맡에 장미도 심지 말고/ 그늘 만들 사이프레스도 심지 마세요/ 내 몸 위의 녹색 풀이/ 비와 이슬방울에 젖게 하세요/ 기억하고 싶으면 나를 기억하시고/ 잊고 싶으면 잊으세요.” 조너선 그린이라는 사람이 엮은 ‘널리 알려진 마지막 말들(Famous Last Words)’은 역사적 인물들의 마지막 말들을 주제와 상황에 따라 분류해 모아놓았다. 그 출처들을 밝혀놓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이 마지막 말들 가운덴 와전되거나 조작된 것도 꽤 있을지 모른다. 아무렇거나 그 마지막 말들의 상당수는 때론 너무 비범해서, 때론 너무 평범해서 인상적이다. 국내외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살인혐의로 교수대 앞에 서게 된 이탈리아계 미국인 무정부주의자 바르톨로메오 반제티(1927년 몰)는 “당신들이 나를 두 번 처형한다 해도 내가 올바로 살았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항변했다. 반제티는 미국 법정이 ‘조작된 살인혐의’ 때문이 아니라 ‘무정부주의 사상’ 때문에 제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국 사법부는 1977년 반제티에 대한 유죄 선고를 취소함으로써, 그가 정치 재판의 희생자였음을 시인했다. 보헤미아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1415년 몰)가 이단 혐의로 화형을 당하며 남긴 말은 그 잠언적 울림으로 널리 회자된다. 그는 불길이 세어지도록 계속 장작을 얹는 신앙심 깊은 노파를 바라보며, 라틴어로 “아, 거룩한 단순함이여!(오, 상크타 심플리키타스!)”라고 한탄했다 한다. 작곡가 베토벤(1827년 몰)은 장년기 이후의 청각 장애가 지긋지긋했던지 죽음을 앞두고 “하늘에선 나도 들을 수 있을 거야”라고 중얼거렸고, 시인 하이네(1856년 몰)는 “하느님은 날 용서하실 거야. 용서하는 게 그 분의 일이니까”라는 말을 남겼다.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라났으나 만년엔 무신론으로 기운 볼테르(1778년 몰)는 마지막 순간에 회심을 요구하는 신부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제발 편히 죽게 날 좀 내버려둬요”라며 짜증을 냈다 한다. 그러나 전태일의 ‘배고프다’는 마지막 말만큼이나 인간적인 것은 테너가수 엔리코 카루소(1921년 몰)의 마지막 말이다. 그는 아내 도로시를 애칭으로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도로,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 ▲ 끔찍한, 그리고 부끄러운… 김선일씨 서툰 영어로 외친 절규… 정부 외면 속 결국 유언 돼버려 근년에 한국인들이 들은 가장 끔찍한 ‘마지막 말’은 이라크 무장세력에게 납치돼 살해된 김선일씨(2004년 몰)의 유언이다. 그 유언은 의도하지 않은 유언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선 그 말을 유언으로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마음에 깊숙한 상처를 남겼다. 공개된 동영상에서 그는 서툴고 다급한 영어로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의 이 절박한 호소를 묵살했고, 몇몇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은 그의 이 마지막 말을 비열한 언사로 모욕했다. To President Roh Moo Hyun. I want to live. I want to go to Korea. Please, don"t send to Iraq Korean soldiers. Please! This is your mistake. This is your mistake. Many Korean people don"t like their (government) to send (soldiers) to Iraq. All Korean soldier(s) must (stay) out of Iraq. Please, please! This is your mistake. Why do you send, why do you send Korean soldiers to Iraq? To my all people all Korean people. Please support me. Please! President please Bush, to President Roh Moo Hyun. Please. I want to live, I want to go to Korea. 노무현 대통령님,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라크에 한국군을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이건 당신의 실수입니다. 이건 당신의 실수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정부가) 이라크에 (군인을 보내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한국군은 모두 이라크에서 나가야 합니다. 제발, 제발. 이건 당신의 실수입니다. 왜 당신은, 왜 당신은 한국군을 이라크에 보냈나요? 고국의 동포 여러분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시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제발. 나는 살고싶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일보] 제공 |